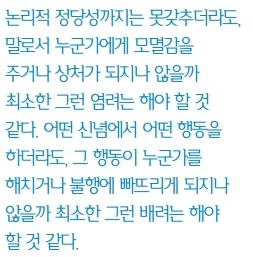|
상대를 혐오하는 말과 글들의 폭포수 …
| |||||||||||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30. 신념 | |||||||||||
| |||||||||||
믿음은 믿는 마음이다.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무엇인가에 대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가 믿음이다. 그것이 정치나 사회 또는 철학적 가치와 관련될 때는 신념이라고 주로 한자어로 쓰게 되며, 뭔가 객관적인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건 신념이건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다. 벤-오일러의 다이어그램에 따르면 진실과 신념의 교집합은 그래서 ‘형편없이 당연시 된 참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 ‘형편없이 당연시 된 참 신념’ 중에 조건이 확실한 경우에 겨우 ‘참 신념’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무한대의 우주! 이런 신념에도 오래 전에 클레임이 걸렸다. 우주를 모래알로 채운다면 10의 63승보다 작을 것이라는 아르키메데스의 신념!
사실 그 옛날에는 고교 수학책에 집합이라는 단원이 없었다면 놀랄 것이다. 수학에서의 집합을 모르는 채로 졸업을 했던 나는 유난히 집합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동생의 수학 책에서 독학으로 집합 단원을 공부했을 때의 신기함이라니!
물론 오늘은 집합 예찬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의 정체를 생각하면서 깊은 회의가 드는 일을 말하고자 함이다. 다 같이 신 또는 신들을 믿으면서도, 다같이 신앙인이면서도 그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증오와 박해를 일삼아 온 종교적 반목이 그 첫째요. 다같이 이념들을 신앙하면서도 그 이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반목의 극치를 달리는 정치가 그 둘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목격자가 둘이면 그 증언은 두 가지라고 한다. 한 쪽이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기억이 두 가지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진 인구수가 4천235만7천906명(19대 대선)이라니, 사람들의 각양각색은 4천만 가지 이상이리라. 정당으로 크게 나누어 말하더라도 여러 신념들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팩트로 드러난 사건을 두고서도 전혀 다른 신념에 입각해서 말을 한다면, 몰라서일까 알고서도 당략 때문일까.
말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가늠해야 할까. 예컨대 ‘지겟작대기’는 긍정적인 표현일까 그 반대일까. ‘선거 때는 지겟작대기도 필요하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지겟작대기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해준다니 고마울까,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표현에 분노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마워하리라고 예상하고 말했을까, 분노하라고 말했을까, 그도 저도 아닌 시선끌기 용이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단수의…. 노련한 정치가가 아닌 평범한 대중들은 그 높은 뜻을 읽지 못하니 답답하다. 다만 최근에 방송에 나오는 말들은 많이 거칠다는 느낌은 확실하다. 신념이 다르면 상대를 혐오스런 곤충에 빗대기도 하니, 인간에 대한 미미한 존중도 없다.
예로부터 신언서판이라고, 그것이 비단 관리 등용의 기준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신체가 미남미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듯이, 특히 말은 ‘비단 혀’가 아니라 그 뜻을 지칭하는 것이고, 글 또한 미려한 서체가 아니라 문필력을 지칭한다. 말(言)과 글(書)은 판단력(判)으로 모아지니, 말과 글의 이치가 우아하고 뛰어난 것을 높이 산다는 뜻이었다. 말과 글이 요즈음처럼 폭포수로 쏟아지면서 게다가 거의 경박한 수준으로 타락하고서야 어찌 바른 판단력을 기대할까. 자신의 판단과 주장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념은, 그런 마음의 상태는 참이 아닐밖에.
신념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했던 체 게바라가 떠오른다. 흔히 신념을 실천한 휴머니스트라 불리는 그에게 신념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여행은 산 경험들을, 꾸준한 독서는 죽은 경험들을 넣어주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상과 신념이 정립됐고, 그러한 신념에 실천이 따랐다고 평전은 말한다. 그렇다면 성공한 혁명의 열매를 누리는 대신 미련 없이 다시 떠나는 신념, 그것은 또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것은 혁명 후 쿠바사회에 대한 회의였을 것이다. 혁명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부활된 사형제도 등 다른 신념을 박해해야 하는 과업이 회의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혁명이 아니라 해도,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라 해도, 이념이 전과 다른 정치체제가 됐을 때는 그런 회의가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사에 관해서는 물론 일반 정치에도 문외한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말과 글이 경박해진 이 시대를 사는 때문이라고 변명이 될는지.
사실 반세기 전만 해도 할 말하고 사는 사람이 적었었다. 개인의 신념은 사치이고, 가치는 주어진 것들을 신봉하면 되었다. 그래서 말과 글로 다툼도 적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그러나 그 신념이 문제다. 어떤 신념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논리적 정당성까지는 못 갖추더라도, 말로서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상처가 되지나 않을까 최소한 그런 염려는 해야 할 것 같다. 어떤 신념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불행에 빠뜨리게 되지나 않을까 최소한 그런 배려는 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로미오와 줄리엣 버금가는 두 앙숙 집안이 있었다고 치자. 옛날이라면 산 넘어 두 집안 간에 만석꾼인가 천석꾼인가를 다투었다고 치자. 두 집안에 공교롭게도 자식이 귀하더니, 어느 한 집안에서 옥동자가 태어났겠다. 그럼 다른 집안은 그 자식농사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걸음발도 떼기 전부터 걷지도 못할 아이라고 저주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정서였었다.
강보에 쌓여있을 때부터 새 정부를 옭아매면 어떻게 할지,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상대에게는 일단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적이라 할지라도 세워놓고 맞싸워야 떳떳한 것 아닌가.
신념이 표현되는 말이라고 해서 사회적 함의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심지어 옳건 그르건 신념조차 수반되지 않은 허구도 남발하는 오늘날, 할말 다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자유는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다.
| |||||||||||
'수필-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필 -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5월의 그날들 (0) | 2018.01.25 |
|---|---|
| 2015 세계한글작가대회 - 대단원을 지나서 다시 한글 (0) | 2017.07.22 |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9. 둥지를 더럽히는 작가들 (0) | 2017.07.05 |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8. 테러에 갇힌 호모 사피엔스 (0) | 2017.07.05 |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7.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0) | 2017.07.05 |
 editor@kyosu.net
editor@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