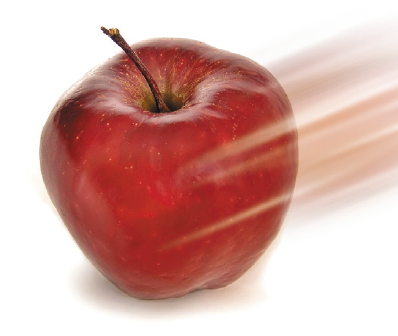|
“서로에게 ‘사과’ 를 한 알 내밀자”
| ||||||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4. 사과 같은 사과 | ||||||
| ||||||
|
겨울을 지나 봄을 맞는 일은 늘 어렵다. 새싹이 돋으려면 얼마나 무진 애를 써서 무거운 흙의 틈새를, 마른 가지의 껍질을 뚫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에게 허가해 준 봄날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그 일’을 보도했고 또 알고서 분노했던 많은 국민들을 엄벌하고 말았을 것을, 이번에는 ‘그 일’을 책임져야 할 주역이 파면됐다. 당위성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냈음이다. 물론 국론의 양분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100명 중 92명이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절대다수가 극소수를 폄하할 수도 없다. 생뚱맞은 말 같지만, 우리 서로에게 사과를 한 알 내밀자!
아버지가 사다주신 紅玉
| ||||||
말장난도 가끔은 쓸모가 있다.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만 어색할 때, 상큼한 사과를 내민다는 것이다. 나도 실제로 사과로 사과를 한 일이 있었다. 지난 신록의 계절 5월 끝자락에 사소한 일로 선배에게 밴댕이 속을 내비쳤었던 일이 있었는데, 평소에 친밀감을 느끼던 사이라서 가슴 아팠다. 그래 놓고 연말을 맞으니 해묵힐 일은 아니다 싶어졌다. 심성 넉넉한 친구가 선배와의 만남을 주선했을 때 슬쩍 사과상자를 들고 찾아갔다. 명절 돌아오니까요…… 우물쭈물…… 지난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 없는 채로 끊어졌던 연줄이 이어졌다. 사과는, 사과의 효력이란 신기하다.
하고많은 과일들 중에서도 보통 사과를 으뜸으로 친다. 사과가 제일 맛있었던 기억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늦은 저녁에 사 들고 오시는 빨간 홍옥의 맛이었다. 할머니가 대청에 쌓아둔 국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상큼한 빨간 사과를 베어 물고서, 상기된 우리는 백설공주가 깨문 사과에 독이 빨간 쪽 푸른 쪽 어디에 숨겨졌을까 서로 우기며 재잘거렸다.
한번은 아버지가 제 아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쏘아 맞춰야 하는 벌을 받은 명사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다. 우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귀를 기울였는데, 대부분의 옛날이야기가 그렇듯 해피엔딩이었다. 명사수는 한 치의 착오 없이 사과를 쏘았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감춰둔 두 번째 화살로 결국 폭군을 끌어내린다는 줄거리였다. 다 자라서야 독일문학의 고전기 프리드리히 실러가 쓴 『빌헬름 텔』에서 그것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 스위스 지방에서 내려오는 전설임을 알게 되었다. 전설에서도 압제자는 결국 내려온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역사에 태초부터 사과가 등장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세기 3:5)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있으랴. 금기의 사과를 따먹은 인간이 신에 버금가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은 순전히 이브의 덕이다.
먼 옛날 트로이 전쟁도 황금사과 한 알이 시작이었다. 브레드가 <만일 If>에서 노래하는 ‘수천의 배를 진수시킬 수 있는 얼굴’은 파리스 왕자가 황금사과 한 알로 얻은 헬레나이자, 그녀가 불러들인 그리스 연합함대를 말한다. 사과는 그리스로마신화의 단골 메뉴다. 달리기의 명수 아탈란테 이야기의 전환점도 사과다. 아름다운 이 처녀를 얻고자 달리기시합에 참가한 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가자 마침내 심판 멜라니온(또는 히포마네스)가 직접 시합에 나섰고, 아프로디테 여신에게서 받은 사과들을 던지며 그때마다 흠칫 흠칫 머뭇거리던 아탈란테를 겨우 이겼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사과는 과일의 중심이었다.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심겠다는 나무가 사과나무였다. 왜 하필 사과나무였을까. 이 무한 긍정, 삶은 다만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스피노자의 인식은 합리적 이성의 방식이다. 그뿐인가. 뉴턴의 사과 한 알은 만유인력에 대한 깨달음을 선물하지 않았는가. 사과의 덕택으로 지혜를 얻었던 호모 사피엔스는 멍청한 감성으로 전쟁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이성에 더해 첨예한 과학을 하는 뇌까지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태초에 사과 이야기는 없는 듯하다. 자생하는 능금에 관한 이야기가 ‘계림유사’(1103년)에 등장하며, 조선에 이르러서는 종묘제사용으로 사용하였다고도 한다. 본격적으로는 광무10년(1906년)에 뚝섬에 원예모범장을 설치하고 여러 나라에서 과수의 품종들을 도입할 때 사과나무도 들어왔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1978년에는 대덕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원에 바로 그 영국에 있던 ‘뉴턴의 사과나무’ 3대손이 이식되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턴이 그 아래에서 명상을 했다던 ‘사과가 떨어진 나무’는 표지를 세워놓았지만 애석하게도 죽어버렸는데, 덜 죽은 곁가지 하나가 과수연구소로 보내져 생명을 회복했고, 후손들이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는 중에 그예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옛날엔, 내가 어렸던 시절엔, 사과는 달걀꾸러미 또는 겨드랑이에 끼고 오는 토종닭 한 마리와 함께 정을 나누는 선물의 대명사였다. 지금은 퍼덕거리는 닭을 보자기에 싸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짚으로 엮은 달걀꾸러미도 사라졌지만, 사과는 여전히 제수용 배와 더불어 명절 선물로 꼽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과궤짝이 더러운 지폐의 이동수단이 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 흑역사의 상징적 장면이었던 2002년 대선의 ‘차떼기 사건’으로 진화하기도 했다. 무려 150억 원이 숨겨진 사과상자들이 트럭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OO당에게 전달된 장면은 첩보영화에서나 봄 직한 장면이었다.
모든 오명과 변칙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상큼하고 맛있는 과일의 으뜸이다. 게다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사과 한 알로 가능하니 얼마나 유용한가. 스스로 잘못이 느껴질 때도 사과를 한입 베어 물자. 이 봄에도 어김없이 사과 꽃들이 필 것이다. 사시사철 신선도를 유지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법이 일치하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수필-기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6. 부활 (0) | 2017.07.05 |
|---|---|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5. 친구 (0) | 2017.07.05 |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3. 다리 밑 (0) | 2017.03.07 |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2. 테세우스의 돛 (0) | 2017.03.07 |
| 교수신문 - 서용좌의 그때 그 시절 21. 내려놓기의 미학 (0) | 2017.03.07 |
 editor@kyosu.net
editor@kyosu.net